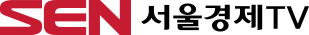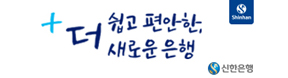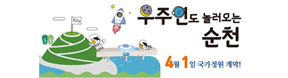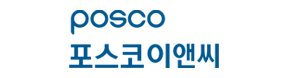[기자의 눈] ‘내집마련’의 꿈…원주민 내모는 일은 없어야

[서울경제TV=지혜진기자]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든 첫 번째 생각은 ‘내 집 마련’이다.
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서부터 서울까지의 거리를 가늠해보며 이곳 정도면 출퇴근하기 괜찮지 않을까, 하남이나 과천은 신혼부부들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세진 않을까, 따위의 고민을 했다. 2기 신도시보다도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후보지들은 내 집 마련의 기대감을 부풀렸다. 수도권 과밀화,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들이 잠시 머리를 스쳤으나 집을 장만하겠다는 욕망에 비할 게 아니었다.
취재차 방문한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는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었다. 토지주들의 목소리였다. 정부와 LH의 토지수용에 반대한다는 주장이었다. “약탈적 수용”이라고까지 표현했다. 남양주 왕숙 토지주 이야길 들어보니 예정지 대부분은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등 제약이 많아서 정당한 토지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.
“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왜 남양주에서 실현하려 하느냐.”
토지주들은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. 하지만 국가사업 앞엔 속수무책으로 보였다. “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원래 그러는 사람들”이라는 지인의 말도 스쳐 지나갔다.
그들의 토로 앞에서 말없이 주억거리던 내 고개가 멈칫한 건 누군가는 세 번째로 터를 옮길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에서다. 터를 잡는 곳마다 신도시가 들어섰다는 거다. 그가 지나간 자리엔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가 생겼다. 왕숙신도시도 생길 참이다.
세입자의 사정은 더 좋지 않았다. 은행 빚 20억원을 들여 고물상을 차렸는데 토지보상으로 10억원 갚고 나면 10억원 빚만 남는 상황이라고. 한 집 건너 한집이 폐허인 공공택지 지구에서 만난 고물상 주인은 내게 말했다. 무허가 사업장은 영업보상금도 없고 이주비 1,00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 게 전부라고.
나를 비롯한 예비청약자들이 ‘서울로, 좀 더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’를 갈망하는 동안 누군가의 삶은 주변에서 바깥으로, 더 바깥으로 밀려난 셈이다.
3기 신도시는 많은 이들의 내 집 마련이란 욕망에 대한 답변임이 틀림없다. 하지만 서울과 그의 주변을 ‘내 집’으로만 빼곡히 채우는 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. ‘절대 선’으로 치부되는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 앞에서 누군가는 바깥으로 탈락한다.
세 번에 걸쳐 신도시를 구상하는 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. 균형발전이며 수도권 집중 등 큰 틀의 관점이 있었는지도 우려되는 바다.
토지보상에 반발하는 토지주의 목소리는 통과의례에 불과할까.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세입자들은 원칙 없는 개발에 피해를 보고 있진 않을까. 내집마련은 서울과 수도권의 과대표된 욕망은 아닐까. /heyjin@sedaily.com
[ⓒ 서울경제TV(www.sentv.co.kr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]